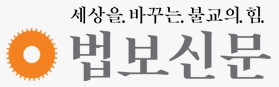
신용훈 호남주재 기자
이 법문은 2024년 7월 14일 담양 정토사에서 봉행된 문사수 대중법회 개원 30주년 기념법회에서
여여 대표법사가 설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문사수법회 대표 여여 법사

부처로 태어난 우리, 성불은 목표 아닌 출발점
成佛(성불)한 채로 태어나지만,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뿐
凡夫(범부)와 聲聞(성문)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규정지어 한계에 가둔다는 점
30년 전 옥탑방서 시작한 법회, 부처님들과 法悅(법열) 만끽한 시간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나의 참 생명은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成佛(성불)은 앞으로 찾아가야 할 목표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불입니다. 성불한 채로 태어나 아들 노릇을 하고 커서 학생이 됐다가,
또 누군가의 아빠도 되고 회사의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불한 존재’라는 출발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간 것 같고 바쁘게 살아간 것 같지만 ‘꿈과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근원을 두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3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3000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3000년 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聞思修法會(문사수법회)는 지난 30년을 나의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꽃밭에 피어있는 꽃을 보아야 비로소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씨앗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흙 몇 센티미터 아래, 또는 몇 미터 밑에 그 씨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씨를 심었을까요?
30년 전 문사수법회는 성수동 옥탑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모셔야 하는데 옥탑방이 얼마나 더운지 모두 러닝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인생을 걸만한 佛事(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성수동이 젊은이들에게 ‘핫 한’ 장소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장에서 액세서리를 조립해 남대문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는 손, 부끄러운 손.’ 머리핀 하나라도 더 조립해 내일 남대문시장에 납품을 해야
경전을 구입해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즐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전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원을 찾는 자리에 섰을 때의 즐거움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法悅(법열) 속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처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오겠죠.
精進院(정진원)이 세워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콘크리트 막사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華嚴展(화엄전)이었습니다.
화엄전에 어렵게 부처님을 모시고 첫 수련회를 했습니다.
당시 50~60명이 모였습니다.
그 좁은 곳에 60여 명이 끼여 앉아 精進(정진)했던 열기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진이 끝나면 속옷까지 젖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야외수련회를 해보자며 텐트를 치기로 했습니다.
텐트를 빌리려니 너무 비싸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싼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텐트를 빌려다가 지금 金剛經塔(금강경탑)이 서 있는 근처에다가 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텐트는 상갓집에서 사용하던 텐트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갓집용 텐트를 쳐놓고도 참 즐겁고 신나게 정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經典(경전) 모시고 공부 좀 하려고 寺刹(사찰)에 자리를 부탁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찰에서 곁방을 빌려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모여 경전 공부를 했는데,
것도 몇 번 지나면 옆에서 목탁을 두들기고 종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나가라 뜻이죠. 할 수 없이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공부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토대로써 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불사를 시작했고,
중앙전법원과 대전전법원이 마련됐고 지금과 같이 정기법회를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문사수법회의 法堂(법당)은 轉法院(전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전법원의 ‘전’자는 ‘구를 전(轉)’자를 씁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상징이 바로 法輪(법륜), 바퀴입니다.
바퀴는 굴러가야 됩니다. 축에 매달려 있는 것은 바퀴가 아니라 장식입니다.
굴러가야 바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절대 굴러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축입니다.
나의 참 생명은 부처님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입니다.
그 축을 불러오는 가장 힘 있는 소리가 바로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입니다.
이 念佛(염불) 속에서 우리는 전법원을 굴려 왔습니다. 그것이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모 조각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나무로 부처님을 조성할 때 은행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는 12월 초에 벤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이때 베게 되면 물이 남아 있어 나중에 썩기 때문입니다.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고 다시 건조 시킨 후에 조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 30년은 우리 안에 있는 물기를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習(습)이 있습니다.
자, 여자와 같이 타고난 습이 있고 돈이 있다, 없다 라는 사회적 평가의 습이 있습니다.
그 습이 빠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法會(법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주변에 수군거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이비 집단이 등장했다.’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절 사(寺)자를 안 붙이니 우리를 보고 사이비라고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주나 점을 봐달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주지스님 어디 계시냐’고 찾으며, 주지스님 없이 머리긴 사람들만 있다며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는 그 시간이 모두 물을 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모두가 갖고 있는 공동의 業(업), 시대의 업입니다.
그 업을 소멸해 나갈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法門(법문) 들으면서 그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願力(원력)을 믿고 念佛(염불)하는 것입니다.
末法時代(말법시대)라고 합니다.
말법시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앞세워서 내가 내려놓은 결론을 관철하려고 하는 시대,
와 내가 눈 부릅뜨고 싸우며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한정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만큼만 잘 살면 된다, 요 정도만 벌고, 이 정도만 좋은 아빠면 된다.
그냥 그런대로 남한테 나쁜 짓만 안 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凡夫(범부) 衆生(중생)이라 부릅니다.
참 생명, 부처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스스로를 단절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범부로 살아도 열심을 삽니다.
나 같은 범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한정 지으면서 그 속에서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부처님 法(법)이라는 지중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공부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법회에 초청을 받아 법문을 하러 갔습니다.
거의 2,0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인 법회였습니다.
그중 책임자 되는 분이 저한테 “요즘 유튜브를 보면 웬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출연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달은 자다. 그러니 이만하면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경전을 다 외운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화엄경을 거꾸로도 외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외우면 뭐하고 거꾸로 외우면 뭐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聲聞(성문) 緣覺(연각)일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알음알이를 앞세우고 체험을 앞세우는 이들 또한 범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범부는 스스로가 범부인지 모르고 성문은 스스로가 성문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지, 법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은 몇천 개의 태양보다도 밝다.’는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밝음 앞에서는 어떤 어둠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밝음 그 자체로 생명은 호호탕탕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내 業障(업장)이 아무리 두터울지언정,
가 아무리 범부요, 성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30년 세월 동안 계속 우리는 법회라는 공동의 업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法會(법회)의 주인은 法師(법사)나 특정 法友(법우) 또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법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이 돼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오래전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법회를 왜 합니까’라는 상당히 원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 모시고 있는 것, 부처님을 모셔서 그분들의 법문을 듣자고 하는 것을
법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부처가 부처로 와서, 부처가 부처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법회입니다.
이 법회는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이 은혜로부터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환희로써 찬란한 삶의 주인공이 돼,
30년 후에도 여전히 우뚝 서 있는 탑을 멋지게 비춰주시길 기원드리며,
법우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개의 댓글